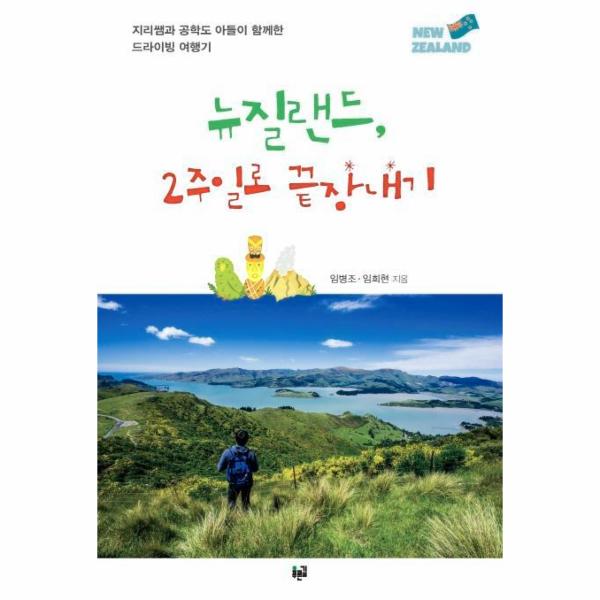머리말
프롤로그 ? 뉴질랜드, 2주일이 딱이다
첫째 날 ? 선진국형 도시가 된 식민지 교두보, 오클랜드
둘째 날 ? 화산과 농목업,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로
셋째 날 ? 화산과 석회동굴, 타우포와 와이토모를 거쳐 오클랜드로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 ? 비행기에서 바라본 뉴질랜드
넷째 날 ? 아름다운 온대 풍광에 오버랩 되는 지진, 크라이스트처치
다섯째 날 ? 캔터베리 평원과 매킨지 분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테카포로
여섯째 날 ? 눈도 마음도 호강하는 후커밸리 빙하 트레킹, 아오라키 마운트쿡
일곱째 날 ? 달리기만 해도 즐겁다, 테아나우를 향하여
여덟째 날 ? 뉴질랜드 여행의 꽃, 밀퍼드사운드
아홉째 날 ?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구 3만 도시, 퀸스타운
열째 날 ? 애로우타운에서 뉴질랜드의 역사를 보다, 퀸스타운에서 와나카까지
열 하루째 날 ? 온대 숲을 통과하는 빙하, 폭스 빙하·프란츠요셉 빙하
열 이틀째 날 ? 호키티카에서 팬케이크바위 사이
열 사흘째 날 ? 서던알프스를 넘어 캔터베리 평원으로
에필로그 ? ‘아름답다’만으로는 …
뉴질랜드, 그냥 가면 양 꼬리밖에 못 본다?!
이 책은 뉴질랜드 여행자를 위한 책이지만 친절한 여행안내서는 아니다. 숙소 예약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먹으며, 자동차에 기름은 어디서 넣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대신에 2주일 동안 뉴질랜드 땅의 겉과 속, 역사와 전설 그리고 경관과 문화가 자연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며 다닌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전에 알고 간다면 장소에 담겨 있는 의미를 더 잘 읽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또 지리 선생님의 수업시간 같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렌터카 찾아 두 시간’을 헤매고, 뭐든 남기고 의미 있어야 하는 아버지가 렌터카 안에다가 배낭을 남기고 렌터카 키를 무인 반납기에 넣어 버리는 등의 뻘짓을 몸소 보여 줌으로써 영사 콜센터와의 접선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경험은 틈새 정보와 교훈을 준다.
여행한 날별로 정리된 각각의 장은 ‘여행 경비로 정리하는 하루’로 마무리되어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준다. 전문적인 설명은 ‘아하!’ 박스 안에 넣어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에 좋고, 낯설고 외진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아쉬운 점은 ‘현이의 Tips &’으로 적어 넣었다. 지면과 글로 설명이 부족할 내용은 동영상이나 해당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열흘에 걸쳐 2,437㎞, 하루에 247㎞를 달리는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하고, 와이파이 환경에 놓일 때에는 다음날 묵을 숙소를 예약하며 지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있을 법한 부자간의 의견 충돌이나 다툼은 전혀 없었다.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보여 주고 싶은 열정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응원하고 때로는 방관하는 아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 이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기를 극도로 꺼리는 아버지의 성향이 전혀 피곤하지 않은 이 책은 뉴질랜드에서 놀고, 먹고, 즐기면서 지적 호기심까지 충족시킬 방법을 담고 있는 완벽주의 여행 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