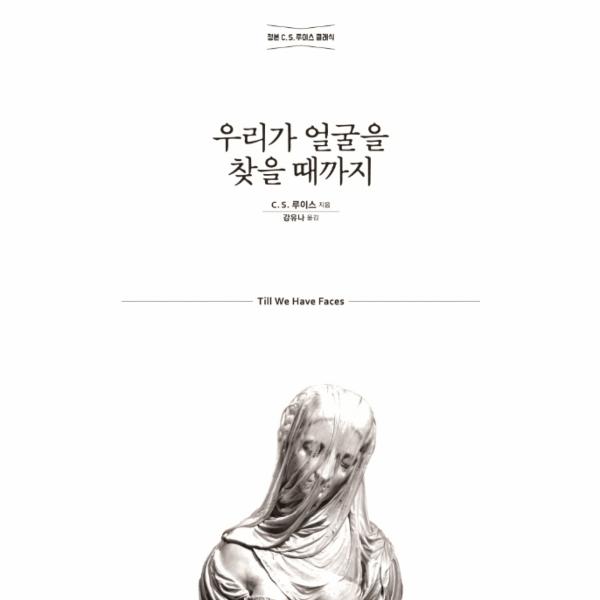편집자가 뽑은 문장
이 이야기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바꾼 부분은 프시케의 궁전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거의 그 순간부터 이 궁전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자연히 내 여주인공의 동기는 더 애매해졌고 성격도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특질 전체가 바뀌어 버렸다. 나는 거리낌 없이 아풀레이우스의 이면을 파고들 수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풀레이우스 또한 이 이야기의 창작자가 아닌 전달자였기 때문이다. 내 목적은 《변신》―피카레스크 소설, 오싹한 희극, 비결秘訣, 포르노, 문체적 실험이 기묘하게 뒤섞인 조합물―의 묘한 특질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아풀레이우스는 천재적인 작가였지만, 이 작품을 쓸 때에는 하나의 ‘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영향’을 받거나 ‘모범’으로 삼지 않았다. _ 11쪽
“후손이라고.”
왕이 말했다.
“후손이라 했겠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으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분노가 하시라도 터져 나올 참이었다. 죽은 시동의 몸뚱이가 왕의 눈에 띄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왕이 물었다. 그리고 여우 선생과 나를 돌아보았다. 온몸의 피가 왕의 얼굴로 몰리는가 하더니 마침내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딸, 딸, 딸년들뿐이로구나.”
왕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또 딸년이 태어나다니. 어쩌면 이리도 끝이 없단 말이냐? 하늘에 계집애들이 창궐하여 신들이 내게 딸 풍년을 내리시는 것이냐? 이년― 네 이년―”
왕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앞뒤로 흔들어 팽개치는 바람에 풀썩 바닥에 쓰러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울지 않는 법이다. 눈앞의 캄캄한 어둠이 가시면서 왕이 여우 선생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대는 모습이 보였다. _ 30쪽
그 순간 나는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 나는 무력했고 그들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