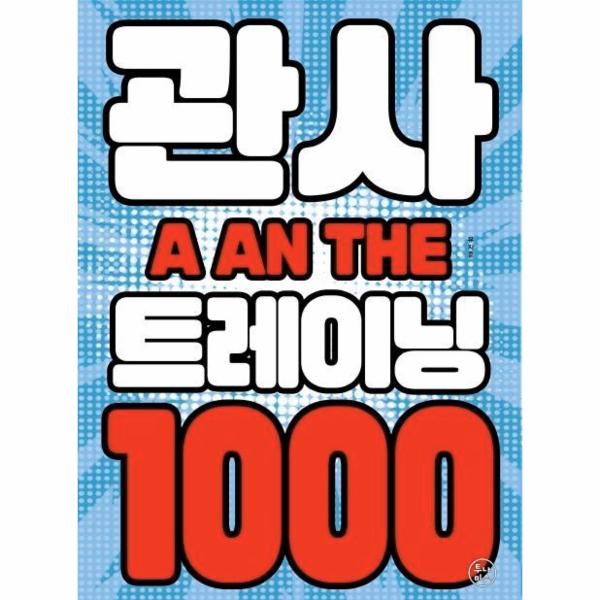대학시절, 원어민 교수가 강의한 영어구문론 과목이 떠오른다. “오늘은 Mr. T를 소개할까 합니다Let me introduce Mr. T today.” 이렇게 운을 띄운 로버트 교수는 교재를 펼치기 전 화이트보드에 Mr. T를 크게 썼다. 정관사 ‘the’를 의인화해서 위트있게 표현한 것이다.
영작 과목에서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관사다. 정관사, 부정관사, 이론은 숱하게 배웠지만 정작 글을 쓸라치면 ‘a(n’를 붙여야 할지 ‘the’를 붙여야 할지 헷갈리기 일쑤인데 로버트 교수도 관사가 어렵다는 점을 자주 강조하곤 했다. 물론 원어민은 분명히 구분하겠지만 이를 설명하자니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수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어찌 다 말로 설명하겠는가?
관사를 이론으로 쓰려면 ‘함무라비 법전’처럼 두꺼운 원고를 써도 다 해결이 안 되는데 설령 그런 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걸 ‘집대성’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암기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다.
물론 관사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알고 있어야겠지만(아주 몰라서는 안 된다! 관사를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과욕은 삼가기 바란다.
관사는 귀납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상이며 ‘감’으로 습득해야 할 어법이다. 숱한 훈련을 통해 감을 익히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다. 이론이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도 직접 써보는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훈련만이 관사를 정복하는 지름길이다.
본문에서
관사,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국민을 위해,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것(정부?은 종언을 고하지 않을 것이다
예문에서 ‘government’는 ‘정부’가 아니다. 왜일까? 작자(링컨가 관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that’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