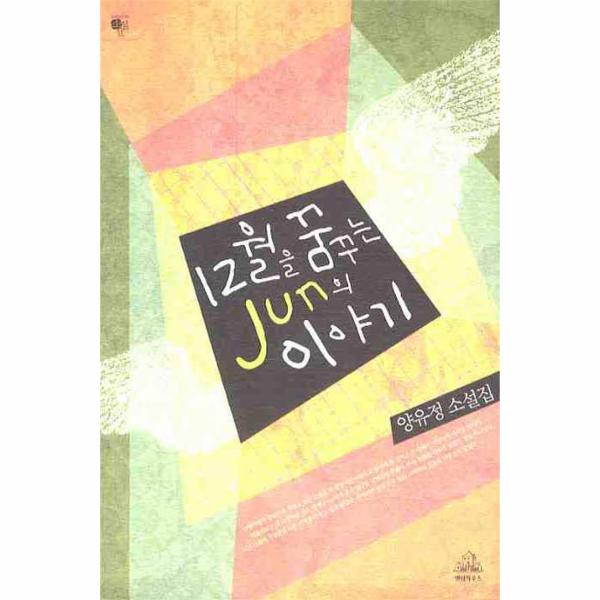출판사 서평
양유정이 얘기하는 우리들의 초상이란 죽음의 기를 들고 출발선에 서있는 모순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 테다. 양유정은 말한다. 착란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시간과 시간 사이 윗집과 아랫집 사이, 구멍 안과 밖의 사이에서 온다는 것을.
착란의 끝에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을 얻기도 하며 몸을 절단하고 도려냄으로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해체로 확장 시킬 만큼 , 그 사이, 즉 그 간극은 결코 가벼운 언어와 시간이 아님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첫 소설집 『마녀가 된 엘레나』에서...
양유정이 얘기하는 우리들의 초상이란 죽음의 기를 들고 출발선에 서있는 모순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 테다. 양유정은 말한다. 착란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시간과 시간 사이 윗집과 아랫집 사이, 구멍 안과 밖의 사이에서 온다는 것을.
착란의 끝에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을 얻기도 하며 몸을 절단하고 도려냄으로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해체로 확장 시킬 만큼 , 그 사이, 즉 그 간극은 결코 가벼운 언어와 시간이 아님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첫 소설집 『마녀가 된 엘레나』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이면성, 그 양면의 시간 속에 들끓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무한의 상상이었다면 두 번째 소설에서 양유정은 양면이 아닌 하나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양유정의 소설은 부메랑에 비유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삶에 대해 던진 물음표인 부메랑은 타인과 사물이 개입하여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여기서 공존은 함께 산다는 것 보다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동시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양유정 소설이 가진 발화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는 3인칭 시점의 서술인 듯하지만, 소설 속 인물이 현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개입은 일반적인 3인칭 시점의 소설들이 가진 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