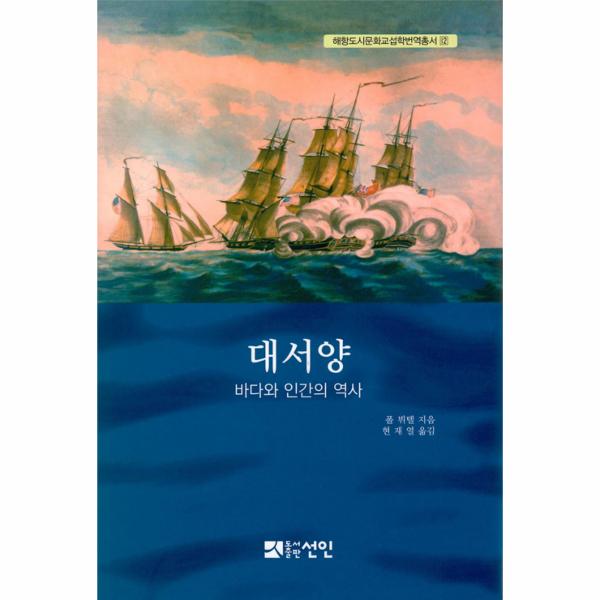영국의 라우틀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기획 출간한 <Seas in History> 총서 중 프랑스의 저명한 대서양 역사가인 폴 뷔텔의 Atlantic(1999을 번역한 책. 대서양이라는 바다만이 아니라 그와 맞대고 있는 양쪽 대륙들의 사정까지도 포괄하면서 쓰여 있기에, 이 책의 내용을 방대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뷔텔은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와 맺은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범위 속에서 변화해 간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한 순간의 놓침도 없이 추적해 내고 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대서양이라는 대양이 인간과 관계했던 과정을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왜 대서양이 인간에게 중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옮긴이는 이 책이 단순히 대서양이라는 지리 단위의 역사가 아니라 대서양이라는 대양과 인간의 관계의 역사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 한국어판의 제목에 ‘바다와 인간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았다. (역자 후기 중
바다는 그 자체로 본래 풍요롭기도 하거니와 수세기 동안 해양을 통해서만 멀리 있는 많은 지역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지 강대국들은 야심차게 제해권을 주장했다. 콜럼버스와 바스쿠 다가마 시대 이래 유럽의 사상가들과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기도 했다. 실재이든 상상이든 바다에 대한 경제·정치·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대국가 권력의 표상인 해군이 발전했다.
해상 무역을 위해 선박을 건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선박은 무엇으로 동력을 얻는가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당시 경제에서 가장 값비싸고 기술적으로 최첨단 제품에 속했다. 세계의 해운 산업은 여타 사회 구성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조직과 생활방식을 지닌 노동자들과 함께 발전했다.
그러나 바다의 역사에는 해양에 대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연대기, 해전, 화물수송량, 선박 건조 그 이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