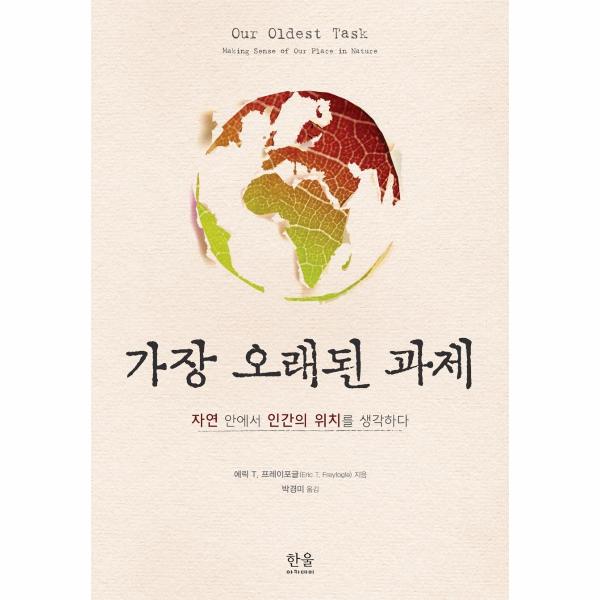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은 전 지구적 생태적 재앙의 시대에 이미 돌입했다는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를 세운다. 여기저기서 기후변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아니 최소한 늦추기라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저자는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을 2017년에 이 책을 냈지만, 책에서는 별로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가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법학 전공자답게 저자는 꼬장꼬장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 나간다. 저자는 흔히 그러듯이 생태 위기의 객관적 증거가 되는 현상들을 나열해서 긴박감을 조성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경향을 피한다. 환경 운동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곧바로 원인 분석,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은 더 깊은 데 있다는 것이다.
생태 위기는 문화의 문제다
저자는 생태 위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범적 가치의 문제, 넓게 말해 문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데카르트 이후의 합리주의 철학을 비판해 온 생태 철학의 흐름이 있지만, 저자는 그러한 철학적 성찰을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과 관련시켜 그 실질적 의미를 밝히며, 근대 문명 전체를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매번 계몽주의로부터 초기 자유주의 사상,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시장 자본주의경제와 시민운동까지 넘나들며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이런 저자의 종합적인 글쓰기 방식은 급한 길을 둘러 가는 것 같지만, 읽고 나면 우리 삶의 실상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특징을 피상적으로 나열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근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근대의 필연성을 밝힌다. 우리가 근대의 미덕이라고 칭송해 마지않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근대의 독이 퍼져 나가는지 그 과정을 밝힌다. 그럼으로써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