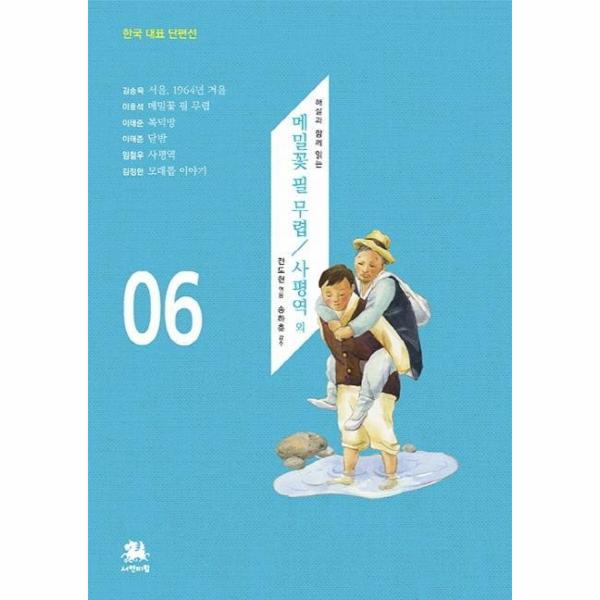책 속으로
이상의 줄거리가 보여주듯, 이 소설은 세 사람이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결말을 보이지만, 이야기는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씁쓸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세 인물의 만남이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은 ‘김’, ‘안’, ‘사내’ 등과 같은 호칭으로만 불린다. 이름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같은 호칭은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비개성적이고 익명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익명화된 존재들은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나 교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나’와 ‘안’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진심을 표현하지 않으며, 무의미하거나 개인적인 자의식을 드러내는 사소한 말들을 주고받을 뿐이다. 그리고 외판원 사내와 동행하면서 그의 사연과 고뇌를 알고는 부담스러워 하며 떠나고 싶어 한다. 사내의 간청에 의해 여관에 투숙했을 때도 그의 자살을 짐작하면서도 외면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여관을 도망쳐 나와 헤어진다.
작가는 이 같은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로 묘사하여, 인간적 유대를 상실한 도시적 삶의 황폐함과 소외 의식을 인상 깊게 부각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이 소설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접어든 60년대 우리 사회의 풍경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쪽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