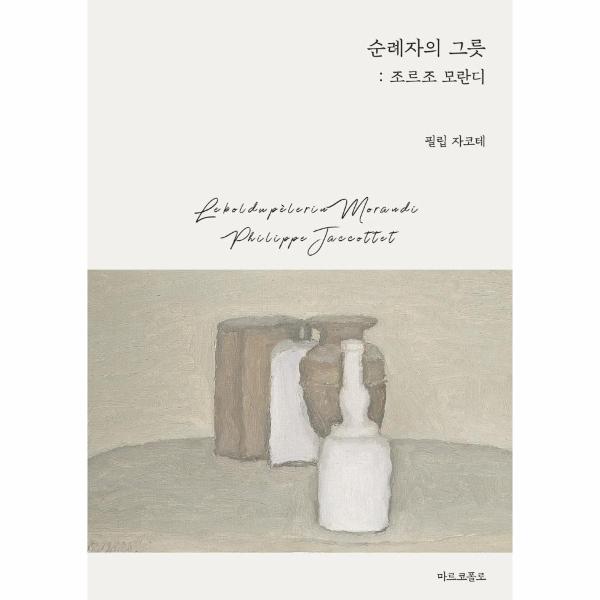책속에서
1991년 피렌체의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에서 열린 전시회의 카탈로그를 다시 뒤적여 보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탄하는 마음이 커진다. 약음기(弱音器를 낀 듯한 그의 기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기술에 역설적으로 감탄을 연발한다. 페이지마다, 정확히 날짜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의 그림은 정상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는 듯하다.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고귀함’, ‘우아함’ 등이다. 이러한 상승 작용, 높게 이어지는 계단은 아주 당연하게도 단테를, 단테의 <신곡> 중 ‘연옥’과 ‘천국’의 여러 구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다고 모란디의 그림들과 단테의 글이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다. 파르나소스산(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산. 실제로 그리스 중심부에 코린트만 북부의 델포이를 굽어보고 있는 석회암 산. -역자주 위에 모란디와 단테를 나란히 세울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비록 좀 더 그럴듯하고 딱 들어맞는 비교가 떠오른다. 평론가 체자레 브란디는 모란디의 회화에 대해 “시간의 바탕에서 추억이 떠오르듯 공간의 바탕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바다 저 멀리 있던 한 점이 점점 배 한 척이 되듯…’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는 놀라운 순간을, ‘연옥’의 제2편에 맞춰 빛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퍼지며 배를 젓는 천사가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