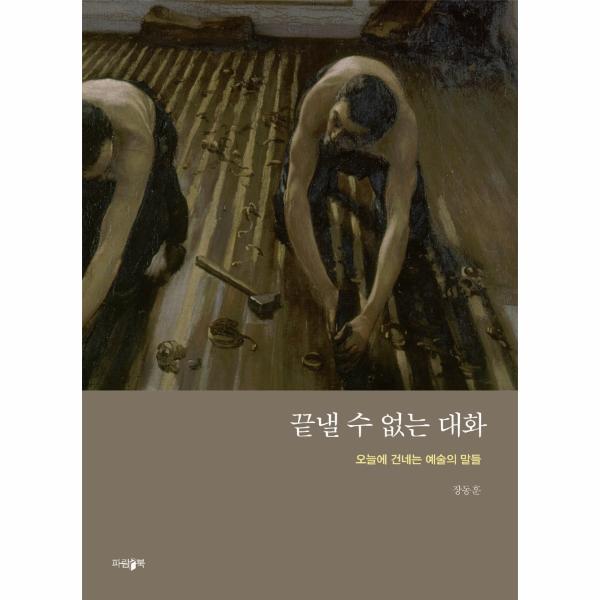책을 묶으며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빛
1부 나와 당신의 세상
불안한 풍경 … 에드워드 호퍼
해체한 세계로 장식한 세계 … 다비드와 프로파간다 미술
네 번째 계급 … 주세페 펠리차 다볼페도
무너지고 공허해진 것 … 리베라와 멕시코 벽화운동
2부 어둡고도 빛나는
허약하지만 질긴 … 피테르 브뤼헐
투쟁하는 인간의 초상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가끔은 뒤로 물러나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렘브란트 반레인과 오노레 도미에
3부 종교 너머의 예수
두 개의 갈림길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차가운 기록 … 한스 홀바인
끝낼 수 없는 대화 … 오윤과 민중미술
종교로 내려앉다 … 바로크 미술
4부 혼미한 빛
화가의 블루 … 조토 디본도네
모두가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 … 프란치스코 고야
변방의 감성 … 알브레히트 뒤러
아르장퇴유 … 에두아르 마네
말을 걸어오는 그림들,
코로나에 지친 당신에게 속삭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코로나와 기후변화의 시대, 우리 가슴을 가장 서늘히 찌르는 물음 아닐까. 사실 이 ‘낯섦’이 지금 이 시점에서만 각별한 것은 아니다. 오늘 유난히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을지언정,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적어도 ‘근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지상에 도래한 다음부터, 세상은 늘 생경하고 불친절한 것이었으니까.
저자는 이야기한다. 왜 낯설어졌을까? 해답을 역사에서 찾자면 비교적 분명하다. 근대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더 넓은 인식의 지평을, 세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니 교회로 수렴되었던 중세의 보편 세계는 해체될 운명이었다. 문제는 믿음 안에서 인간이 누렸던 총체성과 조화로움까지 같이 깨어졌다는 것. 책의 서문, 르네상스 초엽에 그려진 마사초의 그림은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의 슬픔을 표현한다. 하필 근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마사초라는 작가의 입장에선 그렇겠지만, 작품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나머지 교회라는 정신적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르네상스적 인간의 모습은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표현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우리 현대의 외로운 개인들을 그린 미술가라면 단연 에드워드 호퍼, 책의 본문은 바로 그 호퍼의 그림들로 시작된다. 인간은 도시로 대표되는 산업문명을 건설했지만, 그곳에 인간 자신을 뉠 자리란 없다. 지은이가 친절히 해설하는 그 낯선 풍경을 보노라면, 쫓겨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히 되묻게 된다. 저자는 근대가 낳은 여러 그림들을 살피며, 화가의 개인사는 물론, 그 시절의 역사적 구체성을 가감 없이 소환해낸다. 조토의 양가적인 울트라마린 블루에서도, 정체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고야의 거인에서도, 심지어는 명랑하기 이를 데 없는 바로크 미술에서조차, 근대를 겪는 인간의 ‘불안’이 엿보인다. 저자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심정을 가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