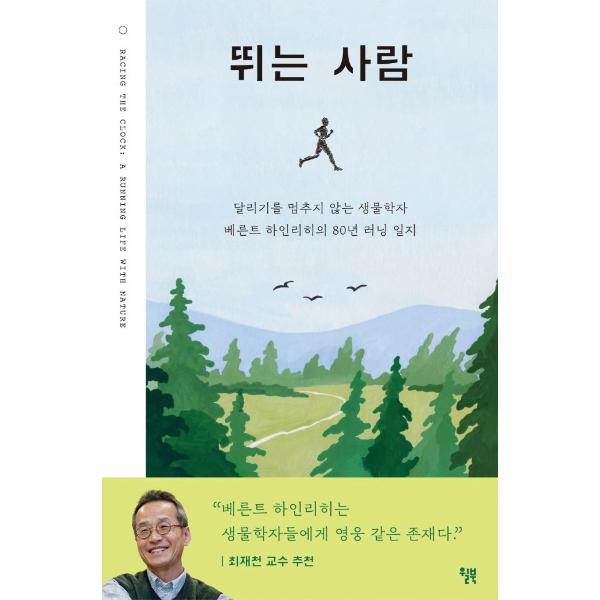본업은 학자, 천성은 러너?
존경받는 세계적 생물학자의 80년 넘는 러닝 이력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100킬로미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해도 괜찮을까? ‘뛰는 사람’의 생체시계는 무엇이 다를까? 평생 달리기를 해온 생물학자는 그 답을 알고 있다.
‘현대의 소로’라 불리는 우리의 주인공, 세계적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의 삶은 단순하다. 메인주 산골 통나무집에 살며 생물들을 관찰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글을 쓴다. 그러나 그의 일상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다. 바로 ‘뛰는 것’. 하루에 30킬로미터를 꾸준히 달린다는 그에게는 ‘뛰는 시간’이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마추어라지만 그의 달리기 이력은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탄탄하고 화려하다. 전미 100킬로미터 울트라마라톤 대회 우승자이자 신기록 보유자이며, 기숙학교에서 지내던 소년 시절부터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틈만 나면 달려왔다. 또래에 비해 몸집이 작던 어린 시절에는 ‘자꾸 달리면 심박 수가 올라가 수명이 깎인다’는 걱정을 들었지만, 그의 달리기 사랑은 고집스러웠고 꺾이지 않았다. 『뛰는 사람』에서는 그가 쉬지 않고 24시간을 달리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선상에서 뛴 이야기, 보스턴 마라톤과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을 뛰다가 벌어진 놀라운 해프닝 등 다이내믹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그에게 달리기란 삶의 절반이자 성실하고 부지런한 학자 생활을 지탱해준 힘의 근원이다.
전업 달리기 선수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고 빛을 내는 가운데서도 마치 하인리히처럼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고뇌를 떨치기 위해, 나아가 달리기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기쁨과 쾌감을 위해 시간을 내어 달리고 땀 흘린다. “달리기는 영혼의 터전으로, 몸과 마음을 먹여 살린다”는 하인리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이 많을 것이다.
‘뛰는 나’를 관찰하고 기록한 흥미진진한 실험
모든 생명에 내재된 ‘생체시계’와 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