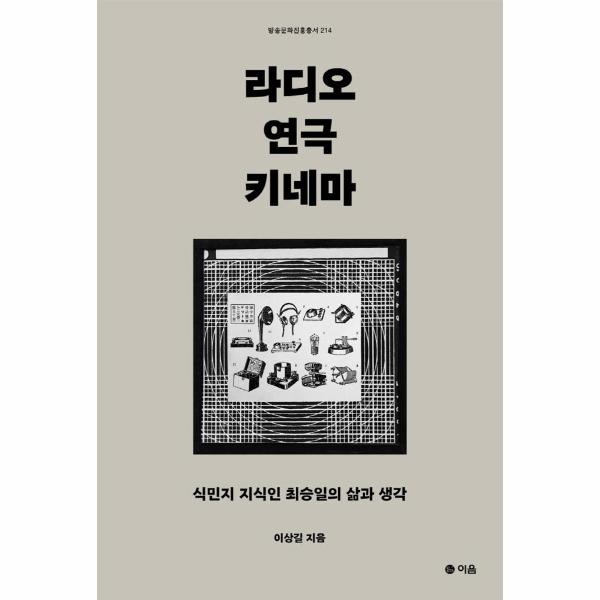한류의 시대, 세계인은 ‘한국적인 것’에 호응하고 있을까?
이 물음은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1997년 5월, MBC는 제목과 가사가 전부 영어로 된 가요 10곡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사실상 방송을 금지시켰다. 음반가요 사전심의가 철폐되어 음악을 만들어 발표할 수는 있지만, “지상파방송에서 영어가 상식선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발돼 국내 정서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어로 발표한 곡이 먼저 해외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다음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해외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사를 영어로만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재에 비추어 적지 않은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이 사례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이 아직 기대와 바람에 머물던 시점에서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한류의 시대, 한국문화의 코드가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여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적인 것’ 역시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금의 성취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렸기에 가능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의 정수는 존재한다. 그 정수를 발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겠으나 한류의 시대에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피는 것은 더 큰 한류의 시대를 기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 1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다. 1930년대 조선 문화예술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조선적인 것’과 ‘조선예술의 세계화’였다. 그리고 그 첨병에는 국제적으로 활약하던 조선 무용수 최승희가 있었다.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