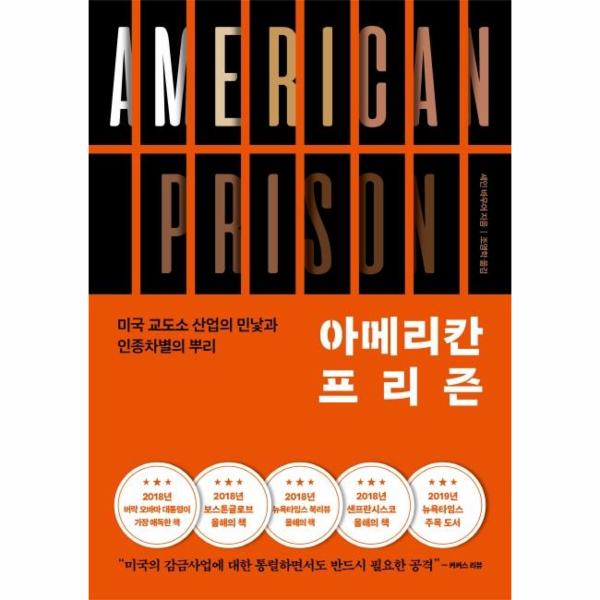형벌의 외주화, 미국식 정의의 붕괴를 가져오다
시급 9달러, ‘특별한 보안 위험’이 없다면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다. 바우어가 일하게 된 윈 교정센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영 교정기업 CCA(후에 core civic으로 바뀐다 산하에 있으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구금 교도소였다. 바우어는 어떠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는 죄수들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손발을 절단한 죄수부터 자살 충동을 호소하며 전문 서비스를 요구하는 죄수, 교도소 내 특수작전대응팀으로부터 최루가스를 맞고 괴로워하는 죄수도 만난다. 죄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절감, 이윤 추구 극대화의 논리가 재소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교도관의 대다수가 흑인이었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그중 다수가 싱글맘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1991년 이후 수십 년간 시급 동결 등의 이유로 교도소는 늘 인력이 모자랐다. 인력이 모자라니 자연스레 재소자 관리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관리?감독할 교도관이 없으니 재소자들은 운동장도, 도서관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재소자들은 그 불만을 교도관에게 터뜨린다. 매일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니 교도관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재소자와 교도관들은 대치 상황에 언제나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양질의 인력이 교도관으로 일할 리 없다.
바우어는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승진을 제안받는다. 그는 잠깐 흔들린다. 승진하게 되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교도소 내부를 활보할 수 있게 되고, 교도소 내부 사정도 더 면밀히 알 수 있게 될 터였다. 교도관으로서도, 기자로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우어는 이내 포기하고 교도소를 제 발로 걸어나온다. 죄수든 교도관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이윤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