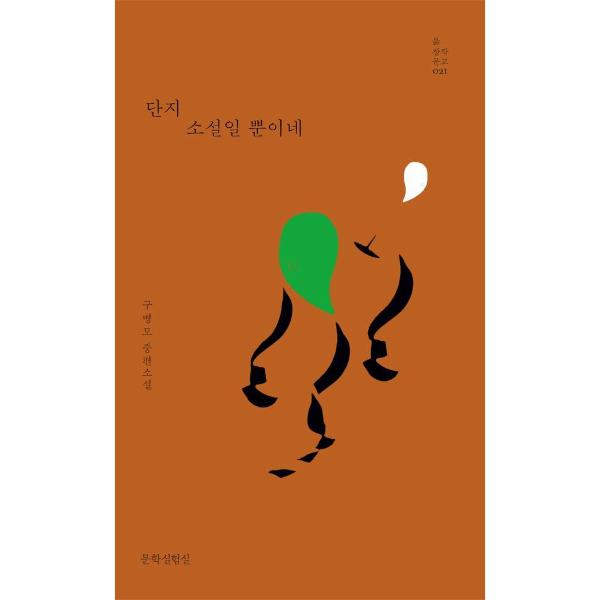소설은 무엇일까요. 서로 알 수 없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놓인 ‘이터널 브리지’ 같은 것일까요.
소설 속에서 S는 ‘이터널 브리지’에 들어서서 사라집니다. 과연 어디로, 왜 등의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지만, 인과도 결론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평생을 순서대로 새겨놓은 듯한 세 사람을 따라가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세 사람이 정말 S의 삶을 대변하거나 상징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S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 세 사람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 삶의 다른 지점으로 S를 이끌고 가는 동방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릴없는 공상 속에서나 진실 여부가 손톱만큼 정도 헤아려지는 이야기를 지어낸 죄를 벌하러 온 저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모두 S의 공상 속에서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S는 사라지고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세계를 완전히 등지고자 자신이 올라선 다리 한쪽을 부러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S는 그저 오랫동안 소설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상태였으며, 아마도 계속 쓰게 될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환멸과 권태, 오욕과 명예 등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소설을 쓰는 자는 소설을 쓰지 않으면 실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으로 일면식 없는 타인들의 공감과 반향을 일으켜야 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는 건 스스로 끝없이 이 세계에서 지워내야만 가능해지는, 악무한의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워내기 위해 소설가는 계속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_ 강정 시인
찢긴 말들 혹은 부재의 색을 알아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거듭하면서…
다리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발단에서 결말로 건너가는 일, 그것은 빨리 감기 버튼으로써가 아니라, 두 발로 천천히 걷다가 가끔은 정지나 되돌리기 버튼으로써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네. 몰입과 속도감을 저해하는 요철과 장벽을 밀어버리고 빠르게 넘어가는 사람들, 불요함과 비실용의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