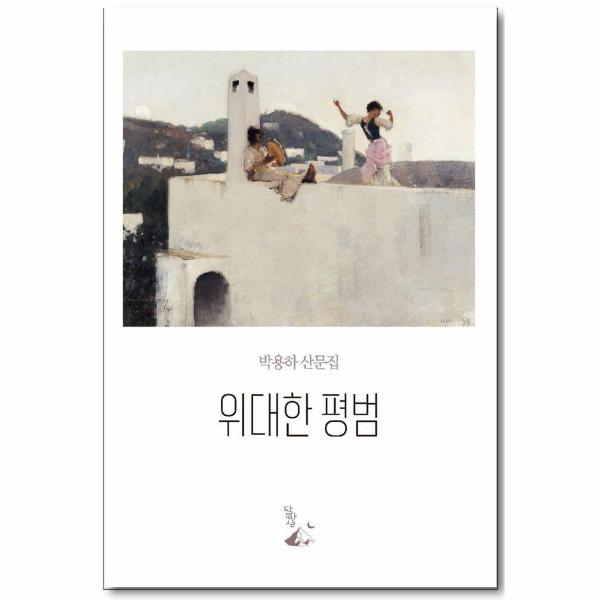시를 발효시킨, 시를 뚫고 나온 산문
― 박용하 첫 산문집 『위대한 평범』
1989년 『문예중앙』을 통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평범을 거부하고, 같음을 거부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오로지 오롯이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해온 시인 박용하가 생애 첫 산문집 『위대한 평범』(달아실 刊을 펴냈다.
시인 박용하는 이 산문집 자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루하루가 일생이다. 일생은 또 하나의 먼 하루. 하루를 살면 하루가 줄어든다. 시를 쓰기 시작한 지 42년 만에 첫 산문집을 낸다. 시는 나의 일. 삶은 나의 시. 매 순간, 이 순간, 모든 순간 시가 반짝인다. 삶이 반짝이듯.”
4부로 구성된 이번 산문집에 수록된 산문은 모두 22편에 불과하다. <2부. 시선과 호흡>과 <4부. 서정과 격정>은 각각 부의 제목과 동일한 한 편의 산문만을 싣고 있다. 두꺼운 시집보다 더 얇은 산문집이다.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다. 반나절도 과하다는 이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읽고 난 후의 당신의 감정은 요동칠 것이다. 섬광과도 같은 문장들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었을 테니까.
다시 냉정하게 산문집에 수록된 편편을 들여다보면 시의 문장인지 산문의 문장인지 도통 헷갈린다. 산문이라고 하기에는 시 같고, 시라고 하기에는 산문이 분명한 듯하니, 대략 시의 언어로 지은 산문이라 할 수도 있겠다. 본문(91~92p에 쓰인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의 산문은 “시가 발효된 산문”이다.
― 잘 쓴 산문이 뭐지?
― 힘 있는 산문.
― 힘 있는 산문은 뭐지?
― 언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산문.
― 언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산문은 뭐지?
― 언어가 피부를 뚫고 나온 산문.
― 언어가 피부를 뚫고 나온 산문은 또 뭐지?
― 몸이 말하는 산문. 사물이 생물 하는 산문.
믿지 않겠지만/믿기 싫겠지만 산문의 저력이 시의 저력이야.
또한 시의 저력이 산문의 저력이야.
시가 발효하지 않는 산문을 무슨 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