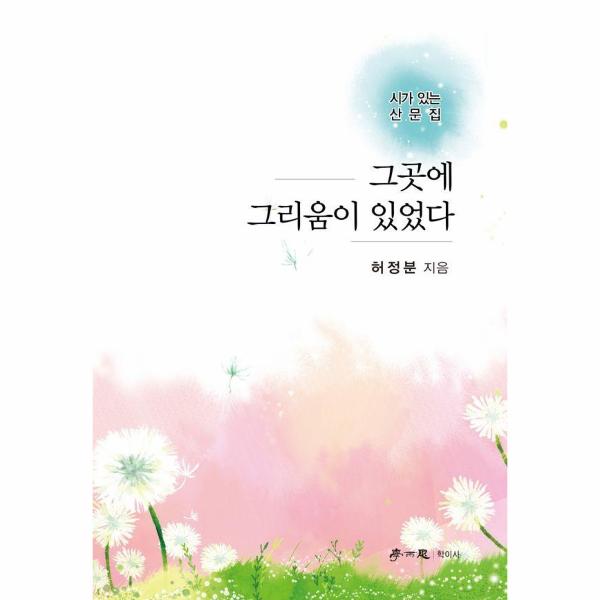1부 첫눈이 내렸다
천사의 나팔 / 청량산 / 첫눈이 내렸다 / 개똥수박이라고 불렀다 / 시래기를 삶으며 / 내 노래 오페라 곡 / 뱀, 그리고 천적 / 두릅나무를 캐내다 / 눈 내리는 저녁 / 개꿈을 꾸다 / 청국장 / 휘청거리는 오후 / 검둥이
2부 그 소년이 온다
샛강에 서서 / …라고만 남아서 / 그 소년이 온다 / 선善, 치사량의 눈물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낯선 죽음 앞에서 / 양 반장은 이 사회의 엑스트라였다 / 어느 무신론자의 한때 / 각본에 없었다 / 3번 국도가 환하다 / 반려동물이 천오백만이라고… / 내 마지막 희망 목록 / 술에 절다
3부 이름이 낯설다
어머니의 요강 / 이름이 낯설다 / 그리움이란 짐승이 동거한다 / 오빠의 뻥튀기 / 나무꾼 아버지 / 생의 흔적, 그대가 혹은 내가 피운 꽃 / 강원도의 힘 / 술 거르는 아내 / 맨발의 꿈 / 약혼사진 / 신神의 이름으로
4부 하룻밤 꿈에라도
한 시대에 이별을 하는 / 하룻밤 꿈에라도 / 벌열미 마을에 산다 / 옛집을 가다 / 음복술 / 사진만 남기고 간 아기별아 / 울음소리가 희망이다 / 느티나무 뒤주 / 오랑캐꽃 / 너를 두고 왔다 / 마을에 600년을 사신 어른이 계시다
책 속에서
유명하다는 교수가 강단에 서고 지역 인사들과 강당을 가득 메운 수강생들이 교수님의 강의에 젖어 드는 시간, 십여 분을 버티던 내 의식은 가물가물 무아경을 향해 눈을 감는다. 그런 순간 환호와 박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꼭… “라고…” 하는 인용사가 귀청을 울려댔다.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기억에도 안 남는다. 그럼에도 남는 “라고…”라는 언어…, 나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석 달을 한 주일에 두 시간씩 여러 강사님께 배운 강의 중에 이 ‘라고’가 가장 인상적인 언어였다.
“숨소리 죽인 아낙들의 거룩한 시선을 받으며/ 유창한 생의 경전을 읊는 교수님 말씀이/ 밤잠 설친 내 귓전에는/ 졸음을 부르는 최면처럼 달콤해/ 깜빡깜빡 눈꺼풀이 보초를 서는 초복날// 하필이면 교수님 말씀 중간중간/ 걸어 나와 한 옥타브 높인/ …라고,/ …라고,/ 인용어를 강조하는 소리만 주워들은/ 知天命 도로아미타불의 공염불”(- 시 「…라고만 남아서」 중에서, 시집 『우리 집 마당은 누가 주인일까』(2005
-p. 71~72, 2부 ‘…라고만 남아서’ 중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별이 된 아가야,/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생시처럼 만나/ 내 손으로 따듯한 밥 한 그릇 먹여 봤으면/ 꿈자리마다 보고 싶은 비몽사몽간에도/ 야속해라 허무해라 애만 타는 나날들/ 할미 곁 떠난 지 반년이 지나도/ 지구별 찾지 못해 못 오시는가,/ 아픈 몸 더 아파서 못 오시는가,/ 무연히 눈뜨는 아침마다/ 허망한 애상에 젖는 할미 마음”(- 시 「하룻밤 꿈에라도」 중에서, 시집 『아기별과 할미꽃』(2019
이별과의 동행이 사람 사는 길 위의 여정이다. 요즘 들어 부쩍 죽음에 대한 상념이 깊어졌다. 사상가도 아니고 염세주의자도 아닌 나에게 과연 예고 없는 죽음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또는 가게 될지 전혀 모른다.
칠십을 살면서 보고 겪은 인간사의 애환 중에 가장 힘든 일이 가족과의 이별이다.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지 오래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