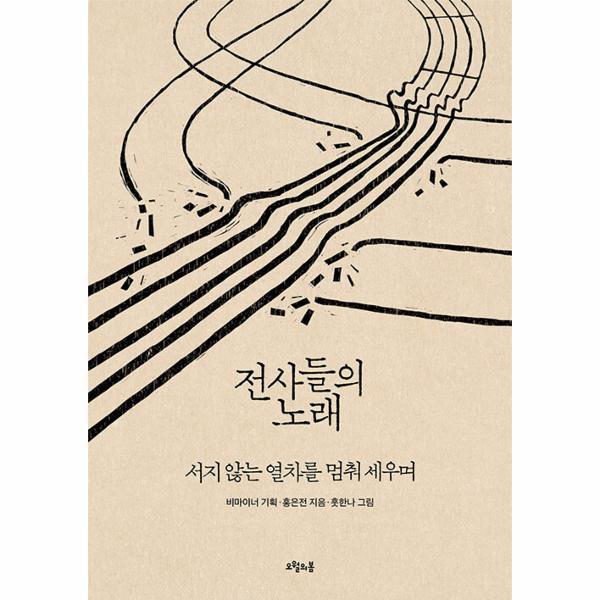숙명宿命의 기록: 차별받은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가 될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1년에도 장애인들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버스를 멈춰 세운 적이 있었다. 쇠사슬로 서로의 몸과 휠체어를 묶은 채 버스를 에워싼 중증장애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라는 언뜻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이 구호에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수십 년간 장애인은 자기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집 혹은 시설에 철저히 유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 벨트인 지하철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자들의 이름이 바로 ‘장애인’이다. 하지만 어떻게? ‘버스조차’ 타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이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운다는 건 얼마나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일인가.
놀랍게도 그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한 이들이 있었다. 차별과 배제라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문제 삼는, 실패할 것이 분명한 싸움. 2001년, 그렇게 비장애인 중심의 질서와 문명을 온몸으로 들이받는 장애인 권리 투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웠다. 당장 가야 할 길이 막힌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며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참 이상한 말이었다. 장애인은 어길 법조차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벼랑 끝인 이들에게 이 사회는 신호를 지키라고 했다.”(홍은전, 〈기록의 말〉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기본값을 뒤흔든 변화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하기만 했다. 싸움을 시작할 어떠한 자원도 없던 시절이었다. 장애인들은 고작 ‘불구’로 낙인찍힌 몸뚱아리 하나로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낚아채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그곳에 묶었다. 배제와 차별의 근거가 됐던 불구의 몸이 싸움의 근거이자 토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거쳐 이곳 우리 앞에 당도했던 것일까?
낮달 같던 시간들: 집구석에서 혹은 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