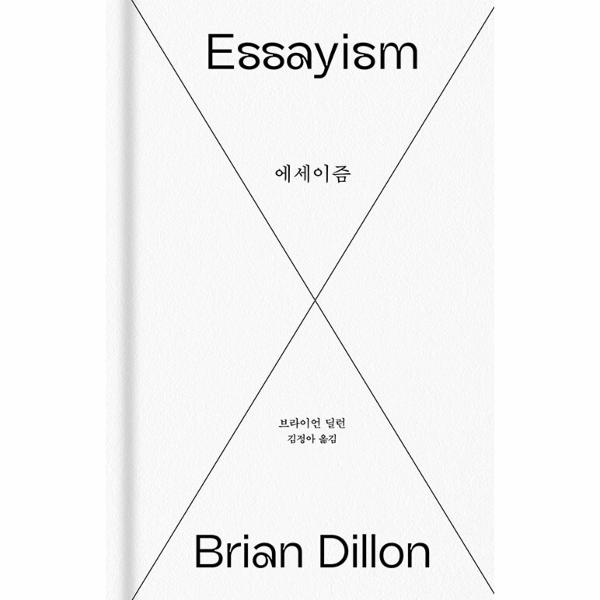오해와 편견 속에 자리해 온 에세이라는 형식
그 기묘한 장르는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몽테뉴, 울프, 하드윅, 바르트, 손택, 디디온…
에세이와 에세이스트들에 대한 가장 문학적인 탐구
우리는 에세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에세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개인의 사정을 세심히 담아낸 글? 경험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 글? 소설을 제외한 산문? 아니면 그냥 가볍게 쓴 글? 브라이언 딜런은 에세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글이야말로 에세이라고 말한다. 이름이나 장르조차 갖다 붙이기 어려운 글, 그것이 에세이다. 에세이는 대개 ‘시도하고, 노력하고, 시험하는 글’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러한 정의는 하나의 작은 출발점일 뿐 에세이를 제대로 가리키진 못한다. 몽테뉴, 베이컨, 울프, 아도르노 등 수많은 문학가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음에도 왜 에세이는 여전히 흐릿하게만 보일까?
그것은 에세이라는 형식의 내재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딜런에 따르면 에세이는 총체와 분산, 완벽과 파편화, 기록과 발명 같은 상호 경쟁적 충동들을 동시에 품은 장르다. 그래서 대칭성과 완전성에 도달하기를 꿈꾸는 만큼이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뉴요커〉는 『에세이즘』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며 이렇게 썼다. “딜런은 에세이를 형식적·기술적 가능성으로 보기도 하고 특정 개념을 전달하는 도구로 보기도 하지만, 비논리성을 감수하겠다는, 심지어 비논리성을 자초하겠다는 태도의 표현 방식으로도 본다.” 그렇다면 에세이와 에세이스트는 무엇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독창적이고도 논쟁적인 답변이 『에세이즘』이다.
위대한 에세이스트들에게 바치는 러브레터
딜런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세이스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그들을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독해해 낸다. 책에서 언급되는 수십 명의 에세이스트 중에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 버지니아 울프, 에밀 시오랑, 조르주 페렉,